
시간은 흐르고 몸과 마음은 굳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눈을 뜨고 일어나 손을 들고 무언가를 듣고 원하는 바를 소리칠 수 밖에 없지요. 마음이 있고, 입이 있고, 귀와 바라보는,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기에.





-어떤 나날은 우리를 깊게도 울게 하고.
일상은 단조롭다. 일하고 도서관을 가고 책을 읽고 분리수거를 하고 이따금 영화를 보고. 길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남자와 통화를 하고 내일 할 일 혹은 오늘 한 말을 곱씹다 일본어와 영어 방송을 조금 보다 잠이 든다. 가끔은, 가끔은 약간 아는 언어의 팬픽을 읽으며 그 의미를 유추해보다 꾸벅꾸벅 졸고.
많은 글을 읽었지만 이제는 문장을 기억하기보다는 흐릿한 이미지만 마음에 새기고. 매섭게 싸우는 두 기관을 오가며 어느 쪽도 서로를 이해할 생각없이 혀만 차대는 둘의 사정을 이제는 알아차린 나만 반쯤 한심한, 나머지 반쯤은 맥빠진 기분으로.
양쪽 어디도 반기지 않으나 다만 자존심으로 누구도 포기하지 못해 일렁이는 표면에 손을 댄 나만 난감하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오래 살아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나, 하는 철없는 마음만.
사람이, 사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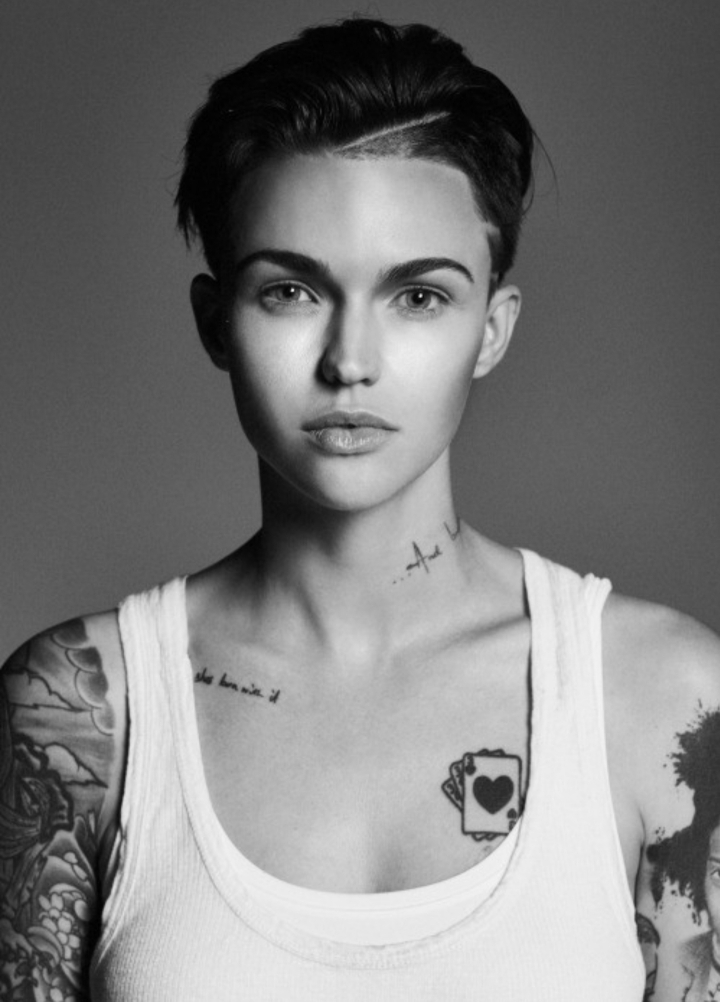
-오랜 연모.
미드소마를 보다 영화관을 나온 경험이 있는 나는 이제 스스로 견딜수 있는 잔혹의 강도를 잘 알고 있어서, 세평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에 안심할 때가 있다.
아침잠이 늘어, 알람을 열다섯 개쯤 맞추고 그 알람을 끄기 위해 만들어진 캡처화면에 웃는 출근길.
내게 학벌이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버틸수 있는, 그럴싸한 입학장보다는 이 시간을 버텼다는 졸업증서가 중요했던. 머리와 지능 또한 알 수 없는 부모보다 환경이 챙긴 체력과 근육, 몰입해 앉을 수 있는 집중력에 많이도 기댔었고.
그래서 나이가 조금 더 들고 어린 층의 수가 얇아지면 그 중요성이 더 낮아질것이라 생각하여 요즘의 세태가 약간 당황스럽고.
학벌이 적절한 운과 시기, 노력할 수 있었던 당신의 과거를 보여주는 것처럼 당신의 미래와 일대일로 등가교환되기엔 힘들어서. 어느 쪽에도 과한 무게를 싣지 않았으면.
꼰대의 발언이지만 과거의 무언가가 미래의 나를 보장해주는 것은 체력 - 건강이 아님 - 뿐인듯.
교수자의 말랑함은 때로 나를 웃게, 자주 나를 짜증나게 하고.




고요한 얼굴과 그 낮은 언어들이 미친듯 좋았으나 조금 더 나이든 배우가 필요했으리란 내 의견은 변함없고. 여전히 설정 외 대사와 행동 연출 장면 연결 모두 게으르기 짝이 없는 영상 속에서 그 얼굴이, 얼굴들이.




-그렇구나, 그저 배부른 마음으로.
장내가 어두워 몇번이나 발을 헛디뎠고, 설명조차 읽을 수 없음에 그저 그 광채와 휘황만을 오래 들여다보며.
여전히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나면 모든 식욕이 사라지고.
소유욕과 물욕이 일렁일 때에도 장엄한 것들을 보면 마음이 잔잔해진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데, 왜 내가 미달하는 모자람을 굳이.
긴 연휴, 전 이틀쯤 출근을 하고 하루 교육을 받고 밀린 책을 읽고 홉스봄의 저서 하나를 원문으로 볼 생각으로 몇몇 전시를 기억해두었습니다. 제가 알고 떠오르는 분들 모두 배부르게 즐거운 연휴 되세요.






Recent comment